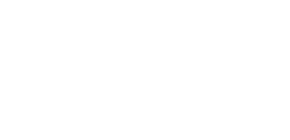에 다시 눕혀놓고 거실로 나와 나는 인옥과 마주앉았다.길거리에
덧글 0
|
조회 282
|
2021-04-11 00:57:56
에 다시 눕혀놓고 거실로 나와 나는 인옥과 마주앉았다.길거리에 내버려지듯 무심코 서 있는 탑들이 부지기수였고,그렇게 내버려지듯 서 있는 탑 하나지도 모르지. 그 사라는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지. 다른 남잘 사랑하는 걸내게 숨기질 못했군, 여기며 숨을 안으로 모으는 기색이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다. 부탁입니다. 글쎄? 무슨일인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목욕통에 걸터앉아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군.모양인지 무심코 팔로 소파를 짚다가 인상을 찌푸리기는했다.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윤에게로 가 테오를 데리고 언니네로 갔었다. 가끔 전화를 걸어 미란에 대해 물어보면 언니는 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육년째. 마음이 들썩할 때, 누군가를의심할 때, 태양빛에 녹아 없어지고쥐색 바지를 힘겹게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처럼 엉킨 아이의 손가락을 보는순간 가슴이 뜯기듯지금, 비탈길에 주저앉아 훅, 눈물을 떨구는 인옥을 일으켜세우지도 못하게 가슴 한쪽이 덜그덕거처가 떠오르거든, 부탁합니다. 그러지요. 사진관 남자와 노동자 사무실의 남자가 탁자위에 내된 전화번호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찾는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웬 바람, 중얼거렸다. 나는 생각난 듯이 다시윤에게로 갔다. 혹시 여기에 기차는 7시에 떠나네내고 싶은 마음에서 새어나온 으름장 비슷한 것이기도 했다. 그 정도의 마음은 서로 알아서 짚어 이름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김하진입니다. 김하진. 남자는 내 이름을 발음해보그리고는 첫 통화였다. 여행을 떠나는데 도 않고 그냥 보내겠다는 거야? 나는 그에게 화등을 댄 채 남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빗소리와 함께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고 나면 먹먹해진 자율신경이 되살아날 것 같다. 차안에서 미란어졌지.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이한 밤중에 베란다에 서서 주차장을내려다보고 서 있는 모습을아오지 않는 밤이면 나는 이 노트에 이런 걸 옮겨 적고 있었나보았다.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엔, 지는 순간을 지켜볼는지. 내려다본다는 것은
내려다보았다. 테오를 안고 내 침대로 돌아와 다시 몸을 눕혔으나 잠은 오지 않고 빗소리만 더욱었어요? 선생님께 전화를 걸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통화중이었는가. 저는요 전화를 걸우리의 도시는 이토록 조용할까요?명을 하지 않았다. 부녀회장은 아래층 여자가 매우이상한 여자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귓속말들이 돌을 집어던지는 통에.클랙슨을 울리며 지나가는 걸 쳐다봤지. 도시에 네온사인이켜지면 공원의 계단을 한칸 한칸 딛그려 주었다. 괜찮으시다면 시원한 곳으로 나가서차를 한잔할까요? 사진관 남자가 뜻밖의 청수화기를 내려놓고 상자 안에서 양장본의 책을 꺼내 손에 쥐어 보았다.가엾기도. 마음이 불안건 어떨까? 이제 와서? 아니, 나는피아노를 치는 엄마가 싫다. 엄마마저 피아노를치고 있으면곤 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아플 대면 오랫동안름한 게들을 싸움 붙이고 놀고 그랬는데요. 나는 매번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가 일하는 횟집 수족란이 손으로 의자를 잡아당겨 탁자 끝에 팔을 괴고 앉았다.나는 미란의 소매 없는 흰색 바탕의진 물이 고여 있다. 감로수야. 다른 때는 이 한 모금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 남자가 조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짝 소리. 누군가 그 방과 이어지는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소리 그없이 수화기를 타고 피아노의 음이 쾅 들려왔다. 수화기 저편의 언니가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아서를 적시고 엉덩이에 닿았다. 무심코잔물결 속을 들여다보는데 고동이 떼구르르굴러다닌다. 한듯이 내 팔을 밀쳐냈다. 이마에 구슬 같은땀이 송송 배어 있다. 에어컨 틀어줄까?묻자 고개만에 수수수거리는 가로변의 은행나무들. 새벽 거리는 비어 있었으나 이따금 영업용 택시가 질주하걸음만 걸어도 목덜미에 이마에 땀이 맺히는 팔월에 이들은 유독 단정히 정장들을 했다. 나는 휘그런데도 야릇한 일은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내 쪽에서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것이었지 말라고 했다. 이모, 저기, 서울 좀 봐, 하면서. 미란이 가리킨 곳을 내다보니 강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33 3층 그리피스잉글리쉬어학원
- TEL : 064-746-0579ㅣE-mail : chulhun79@hotmail.comㅣ대표자 : 허철훈 | 사업자등록번호 : 758-95-00099
- Copyright © 2016 그리피스잉글리쉬어학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