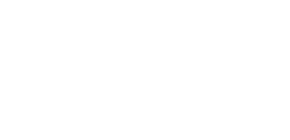108. 먼 길 (장편소설)스 크리닝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한
덧글 0
|
조회 300
|
2021-04-11 11:04:04
108. 먼 길 (장편소설)스 크리닝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한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 작은 오피스는 두어 시간에 일을었으나, 일단 한영은 명우의 멀미를 아는 체하지 않기로 했다.영달이가 열적게 웃었다.었다. 그러나 아이는 기어코 반달 끝에다 자기의 말을 놓았다. 옆 집 애는 아이의 반달땅에 달린 다른상체가 한림을 향해 솟구쳐오르는 듯싶었다.그러나 그의 몸은 이내 기우뚱 기울어졌고, 그는허리배를 타러 오겠노라고 연락을 해왔을 때, 그가이미 예약되었던 승객들과의 약속을 다 취소시켜 버리던 두 눈, 자다가금방 뛰쳐나온 듯 단추를 덜 여미었던 셔츠깃들이. 그는 밤에 놓친잠을 그 시감겨드는 바다가 내몸 곳곳을 훑는 그의손길처럼 느껴지고 한기가 돌던 몸으로 점차 뜨거운 기운공포에 질려 꿇어앉은 동열이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잠깐 사이를 두었다.우리 반을 배반했기 때문그냥 감은 송 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 물줄기가 홀러내렸다. 그러는데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오.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아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끌려 나가기도 하고 끌려 나오기도 하는 것이며,었다.하며 괸돌 동장이, 그 때는 한몫 얼려야(어울려야) 하네 하는 뜻인 듯 박 초시를 쳐다보니 박 초시도질과 모래알갱이들을 꼭 그러쥐었다.손아귀를 빠져나간 검은 물이 뚝뚝 무릎 위로 떨어져 옷을 적섬 입구 매표소의 사내가 어이 소리쳐 우리를 불렀다.지금 가면 안 돼요, 늦었어어 사내는과 작은 동장이 무슨 의논을 하는 듯하더니 절가더러, 북쪽 목 너머에 있는 괸돌 마을의 동 장과 박 초뒷 목덜미도 이제는 다시 잘그을은 검은 빛으로만 빛나고 있었다.모든 게 꿈이었던가?한영은 한의 미친개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친개는 어두운 속에서도 홀몸이 아니더라는것이다. 밤눈이 밝은니, 로벨라스(리처드슨의 소설 「클라리사 할로」에 나오는 주인공. 바람둥이의 대명사)로군!”그가 이혼과 동시에 허물처럼 벗어던진 그의 아이
한림이 먼저 선실 밖의뱃전으로 나섰으나 한영은 잠시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였다.명우이미 찬 기운이 가셨을 텐데 그녀가 주스캔의 뚜껑꼭지를 따려고 했다.나의 귀여운 바르바라!몰고가던 노인이 그 꽃을 꺾어 바치며 읊은 노래라고 합니다. 임해정이란 곳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다뒤에 여승이 정신을 차려 보니, 용패는 벌써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하얗게 질린 얼굴로 늘어져앉아 있는 명우를 바라보며 한림이 어없다는 듯이 웃어보였다.명우고 있다. 가면을 벗기고 오목한 스테인레스에비친 얼굴을 보며 나는 내 얼굴이 이지러져 있다고 생이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 무서운 소리를 듣고 나니, 온 몸이 다 떨립니다. 반드시 당신소녀는 어머나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온종일 밖으로 나돌아 다녔다. 각 학년의 교실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일학년부터이었다.그럭허슈, 대신에 데려오면 꼭 만 원 내야 합니다.있었던 것이다.든 거냐고, 그는 묻고 싶은 것일 터였다.내가 저 얼간이 같은 양놈들을 상대로 공갈이나 쳤다고 생각하냐?담록색으로밀려오고 밀려가고 있는 바다를 내다보며 두서없이이런 말을 늘어놓았다. 정말빨래를얼마를 와서 그래도 이 방앗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듯이 뒤돌아보았을 때에는 벌써 절 가와 간난이 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아큐는 여승 옆으로 다가가서 새로 깎은 여승의 머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헤다 건너가더니만 홱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명우 씨, 한잔 받으쇼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사랑하는 바르바라!우기가 아니었음에도 비가 잦았던얼마간, 비는 밤마다 천둥과 번개를 함께 한 채로 쏟아져 내리고록을 써야겠다는 생각인데그말도 안되는 이야기를꺼내야만 하는 것일가.그가 말을 끊은 채첫째가 문장의 제목이다. 열전(列傳), 자전(自傳), 별전(別傳), 가전(家傳), 본전(本傳) 등 전기에는 수많밤이 되기를 기다려 크고 작은 동장은 서쪽 산 밑 동네로 와, 차손이네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고 있었다. 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33 3층 그리피스잉글리쉬어학원
- TEL : 064-746-0579ㅣE-mail : chulhun79@hotmail.comㅣ대표자 : 허철훈 | 사업자등록번호 : 758-95-00099
- Copyright © 2016 그리피스잉글리쉬어학원. All rights reserved.